우리 곁의 인권위원회 [2018.04] 알록달록 세상 예쁜 인권을 만나다
글 노미연

강의를 통해 만난 아이들에게 물었다.
“인권이 뭐예요?”
“사람의 권리요.”
이구동성이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할 말이 있는 친구가 덧붙인다.
“사람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요.”
알록달록 인권을 만나다
인권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었고 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큰소리를 낼 줄 안다. 오늘도 나는 인권 강사로서 가진 나의 소신대로 재미있고 쉬운 인권 이야기보따리를 펼친다. 강의 때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도 내 시야를 가득 채운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유난히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었고 볼이 통통해 귀여웠다. 큰 눈망울은 깊숙이 자리하여 이국적이다.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만난 그 아이는 한눈에 보아도 다문화 가정의 아이다. 나는 인권을 말하려 아이들을 찾았고, 내가 찾은 그 학교는 전교생이 18명인 아주 작은 사회였다. 소란스러움이 가시고 아이들과 함께 두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성향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소 폭력적이어서 관심을 많이 두어야 할 아이,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더 많은 대화를 하고자 하는 아이, 호기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은 아이 등 18가지 색깔을 가진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이 모두 똑같이 나누어 가진 공통점은,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할 소중한 권리의 주체라는 것이다. 그날의 강의 내용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의 차별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 있었다. 미리 선생님과 통화를 해서 다문화 가정의 비율이 파악이 된 터다. “친구 중에도 다문화 가정 친구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부르나요? 성은 다 이름은 문화예요?” 까르르르 아이들이 웃는다. “아니요, 이름을 불러야 해요” 아이들의 수준은 인권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기특하다. 감수성을 이야기하며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서로 자기의 생각을 말해보는 제법 진지한 시간이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적었다.
다문화 가정이 만든 숙제
인권의 이해가 아이들의 생각을 연다. 그런데 아까부터 내 시야 속 그 아이는 좀 허술하다. 교실과 밖을 왔다 갔다 하기도 여러 번이고, 더구나 연필조차 준비가 안 돼서 다른 친구에게 부탁을 했으나 돌아오는 것은 매몰찬 거절이다. 아이는 어색하게 앉았고 이를 지켜보던 선생님은 얼른 다른 친구에게 연필을 빌려서 아이에게 건넨다. 그 모습이 매우 익숙해 보였고 다른 친구들도 그리 신경 쓰지 않는다. 그 아이에게 따라간 나의 마음이 자꾸 신경이 쓰인다. 사회적 약자라는 마음이 더 앞섰던 것은 아닐까? 혹시 이런 마음마저도 편견과 차별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짙다. 그 아이를 보면서 다문화 가정을 새삼 깊이 생각하게 된다. 다문화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다른 국적 또는 문화의 사람이 만나 이룬 가정이다. 이제는 전국 어디를 가도 쉽게 만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다.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이 생겨난 배경에는, 1990년대에 이촌 향도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해 급변해온 사회 환경이 있다. 그러던 중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 나라의 방송이나 매체에 좋은 이미지로 비치며, 21세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생겨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농촌 총각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여성들과의 결혼이다. 그렇게 생겨난 우리나라 다문화 인구는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현재도 다문화 가정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낯선 환경과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기존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권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가 된 지 오래다. 이는 급격한 사회의 변화가 만들어낸 상황에 대한 반대급부로 형성된 당연한 오해임이 틀림없다. 거시적으로는 국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미시적으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대중매체들은, 특히 명절 때면 항상 그들의 생활 모습을 담는다. 텔레비전 속 그들은 자신의 문화를 알리고 모국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행복한 문화 교류를 진행한다. 화면만 보고 있노라면 우리에게 차별은 다 사라진 것 같다. 그러나 그 축제가 끝이 나면 행복해 보이기만 했던 그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차별과 편견은 다시 숙제가 되어 돌아온다.
선생님! 갸는 냅둬부러요
지금은 다문화 가정의 첫 세대들이 초등학생이거나 유아기에 있다.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 아이들이 온전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라 우리나라를 진정 사랑하며 우리들의 미래로 자라기를 희망하는 건 무리한 기대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나는 인권을 이야기하는 강사로서, 그들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특정지어 부르는 것 또한 차별이 아닐까 생각하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들이 더 이상 사회 문제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햇살은 운동장을 가득 채우고, 조금 전에 만난 교감 선생님이 자랑했던 나비골프의 흔적들이 아이들의 함성만큼이나 한가득이다. 학교 현관 앞을 크게 장식한 전교생 나비골프 스코어판 속 스코어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강의를 마치고 모두 식당으로 서둘러 간다. 그런데 누군가 내 손을 잡는다. 아! 그 아이다.
“선생님! 밥 먹고 가요.”
아이의 두 눈은 간절했고 통통한 볼은 상기되어 빨갛다. 이끌리듯 들어선 식당의 음식에는 정이 담뿍 담겨 있다. 작은 시골 마을의 잔치마냥 분위기도 맛도 아주 좋다. 배식을 해주시는 분도,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한자리에서 모두 식사를 한다. 종알거리며 따라다니는 그 아이의 표정은 너무나 만족스럽고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밥을 먹는 것보다 이야기에 더 열중하던 나를 향해 옆자리 남자아이가 외친다.
“선생님! 갸는 그냥 냅둬부러요.”
‘아뿔싸! 난 오늘 이 아이들에게 무슨 교육을 했다는 거야.......’
노미연 님은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에서 위촉 강사로 일하고 있으며 수필가로도 활동 중입니다.
화면해설.
이 글에는 활짝 웃고 있는 여자아이, 막대사탕을 입에 물고 있는 여자아이, 다문화 아이 두 명이 한 이불을 머리까지 덮어쓰고 웃고 있는 사진과 인권에 대해 초등학생들이 적어놓은 포스트 잇이 몇개 있습니다. 포스트 잇에는 '인권은 학용품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거니까." "인권은 핫팩이다. 왜냐하면 따뜻하기 때문이다." :게임. 하면 행복하니까." "인권은 우정이다ㅏ. 왜냐하면 우정이 있으면 기쁘기 때문." "인권은 꽃받이다. 다른 종류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으니까." "인권은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쓰여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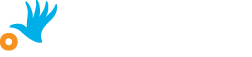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