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돋보기 [2018.09] 돌아갈 수도 떠날 수도 없는 칼날 위에 서다
인권편집부

“전쟁이나 재난 따위를 당하여 곤경에 빠진 백성.”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이 정의하는 난민(難民)의 의미다. 국제협약에 규정된 난민의 의미와는 사뭇 다르지만 ‘국가와 관련된 곤경’이라는 의미에 주목한다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영화 <터미널>과 <디판>은 바로 그 곤경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다.
선의로 채워진 판타지의 세계, <터미널>
영화 <터미널, 2004>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출연 톰 행크스(빅터 나보스키), 캐서린 제타 존스(아멜리아 워렌), 스탠리 투치(프랭크 딕슨)
스티븐 스필버그의 2004년작 <터미널>은 떠날 수도 돌아갈 수도 없어 공항에 살게 된 한 남자의 이야기다. 동유럽의 가상 국가 ‘크라코지아’에서 온 빅터 나보스키(톰 행크스)는 부푼 마음으로 JFK 공항에 들어서지만 국적국에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여권이 정지되고 만다. 설상가상으로 미 국무부가 입국 비자를 취소해버리자 그는 집으로 돌아갈 수도, 뉴욕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한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나보스키는 난민이라 할 수 없다. 국제협약의 규정과 달리 그는 정치적·종교적 위험 때문에 박해를 피해 뉴욕을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사적인 이유로 뉴욕에 들렀고,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해 공항에 머물게 되었을 뿐이다. 나보스키가 머무는 공항은 판타지에 가까운 공간이지만 그가 언제든 난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화 속 설정은 시사적이다. 현대 국가라는 제도가 신분이 증명되지 않는 이방인에게 무작정 친절할 수도 없으려니와, 내전 상황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가 안전하리라는 보장 또한 없다. 영화는 정치적 갈등이나 충돌 대신 나보스키의 좌충우돌 공항 생활기에 집중하지만 스크린의 이면에 다른 이야기가 존재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영화의 원안이 된 실화 속 주인공이 그러했다. 1988년 8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무려 18년 동안 프랑스 파리의 드골 공항에서 살았던 이란인 메르한 카미리 나세리. 그는 팔레비 왕조 반대 시위에 참여한 경력 때문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간 고국에서 추방당했고, 필사적으로 망명지를 찾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마지막 희망인 프랑스에서도 입국을 거부당하자 마지막 기착지인 드골 공항에 눌러앉았다. 국적국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누구든지 난민이 될 수 있는 현실이 나세리의 이야기에 있다. 선의의 판타지로 채워진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이면, 현실의 민낯인 셈이다.
국가라는 질서가 만든 곤경, <디판>
영화 <디판, 2015>
감독 자크 오디아르, 에포닌 모멘큐
출연 제수타산 안토니타산(디판), 칼리스와리 스리니바산(얄리니), 클로딘 비나시탐비(일라이얄)
엄혹한 현실과 선의의 판타지가 부대끼는 영화는 또 있다. 2015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영화 <디판>이다. 스리랑카 내전을 피해 프랑스를 찾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는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후에도 생존을 위해 여전한 참혹을 견뎌야 하는 이들을 그린다.
내전으로 가족과 친구, 고향을 모두 잃은 남자는 망명을 위해 가짜 가족을 만든다. 디판이라는 남자와 그 가족의 여권을 사서 프랑스에 도착한 남자 일행은 가족 행세를 한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족을 흉내 내는 사이, 그들 사이에는 이방인으로서의 연대의식이 쌓인다.
영화는 가족이 되어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 안에 담긴 것은 새로운 땅 위에서도 온전히 안정된 삶을 살 수 없는 난민의 생활 그 자체다. 무법지대가 된 국가가 삶을 위협했기 때문에 고향을 등져야 했던 이들은 새로운 국가에서도 무법지대 내 최하층의 삶으로 내몰리고 새로운 삶을 꿈꿨던 이들의 세계는 천천히 무너져내린다. <디판>은 이 와해와 좌절의 과정을 담는다. 그저 살고 싶어서 자신의 나라를 등지고, 조금이라도 행복해지고 싶어서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을 버티는 사람들. 그들은 결국 국가라는 질서가 만든 곤경을 벗어나지 못한다. 돌아갈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발버둥 칠 뿐이다.
영화의 결말부에 에필로그처럼 붙은 삶은 판타지다. 새 국적을 획득하는 길은 험난하고, 제도가 동댕이친 개인이 체제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현실적 불행 위에 급히 놓인 이 환상은 그래서 더 비극적이다. 누구나 곤경에 빠질 수 있다면, 누구나 불행해질 수 있다. 판타지 안에나 존재할 법한 선의가 필요한 시절, 난민의 삶을 그저 관망만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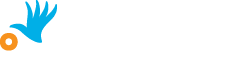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