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속의 인권 [2018.10] 인권을 먹다 : 국가폭력 이야기
인권 편집부

글 변상철
펴낸 곳 네잎클로바
인권을 먹다 : 국가폭력 이야기
음식 전성시대다. ‘전국 5대 빵집’, ‘서울 3대 족발’ 등 음식별 맛집 목록이 나도는가 하면 TV에서는 예능, 생활정보, 여행 프로그램마다 맛집을 소개한다. 음식과 관련된 책도 많다. 이 책에서도 음식을 말한다. 그리고 인권을 말한다. 대체 음식과 인권이 어떻게 붙은 것인가 궁금해 책장을 넘기다 보면 익숙한 음식마다 묻은 국가폭력의 기억을 접하게 된다.
저자는 나눔의 집에서 역사관 연구원으로, 국정원 진실위원회에서 조사관으로,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관으로 지난 이야기를 듣고 남기는 일을 해왔다. 공식적인 조사관의 일은 끝났지만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만난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음식으로 기억하는 그가 24가지의 음식들을 골라 이야기를 더했다.
낯선 이와 친해지려면 밥부터 먹어야 한다고 했던가. 간첩으로 몰린 수의사와는 막국수를 먹었고, 고문 기술자를 만나서는 생선 요리를 먹었다. 함께 먹은 음식도 있고 기억을 소환하는 음식도 있다.
1971년 열다섯 살에 오징어 배를 탔던 소년은 북한 경비정에 피랍되었다. 어선을 지켜야 했던 해경과 해군은 도망갔다. 북한에서 1년 7일을 보내고서야 남북 화해 모드가 되어 다시 고향 속초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국가는 납북된 책임을 어선에 씌웠다. 집으로, 배로, 식당으로 감시가 이어졌고, 납북 전력이 있으니 배를 타지 말라던 경찰에 화가 난 어민은 술김에 “경찰 다 죽이고 싶다”고 소릴 질렀다. ‘경찰을 살해한다고 하고 북한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간첩이 되었던 이가 저자에게 내어준 음식은 냉면이다. 이렇게 음식을 통해 풀어가는 국가폭력의 기억은 대체로 참혹하고 가끔은 따뜻하다.
조작 사건으로 뒤집힌 삶에 대한 가슴 아픈 기억을 되짚는 개인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삶과 공동체를 모두 파괴하고 마는 국가폭력의 거대한 상처를 함께 목도하게 된다.
저자는 이근안과 생선 요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당뇨 때문에 맵고 짠 음식을 먹지 못해 생선 요리를 먹어야 한다는 이근안은 안기부에서 내린 지시에 따라 ‘조사’를 했을 뿐이고 죄라면 ‘애국’한 죄뿐이라며 항변한다. 유대인 학살을 조사했던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말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1)을 여기에서 만난다.
국가는 존재를 위해 개인의 자연권을 제한한다. 홉스는 국가를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다괴물 리바이어던에 비유했다. 리바이어던은 수많은 사람의 얼굴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을 하고 한 손에는 정치권력을 상징하는 칼, 다른 손에는 종교 권력을 상징하는 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다. 국민의 뜻을 한 몸에 가진 절대 개체가 이런 권력을 가진 이유는 사람들의 생존 보장과 평화 유지를 위해 개인의 자연권을 통제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절대 권력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폭력을 행사할 때 쓰는 가면의 이름이 애국이다.
가면을 쓴 괴물은 어떤 이들에게서 음식을 빼앗았다. 책의 첫머리에 나오는 오송회 사건의 피해자는 국물이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 대공분실에서 조사 받을 때 당한 물고문 탓이다. 책에 두 번이나 나오는 짬뽕 역시 고문의 도구였다. 폭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은 피해자에게 짬뽕을 시켜주고는 면만 먹고 국물을 남기면 더 맛있게 먹게 해주겠다면서 남긴 짬뽕 국물을 코에 부었다.

이 책이 받은 여러 평가 중에는 ‘가장 슬픈 음식 기행’이라는 말도 있다. 국가폭력에 희생된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만큼 가슴이 먹먹한 때가 대부분이지만 지금은 다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아 나름의 위안도 된다. 짬뽕 국물의 사연을 전한 김상원은 무죄선고를 받고 고향 마을 입구마다 현수막을 걸었다고 한다.
“1983년 8월 안기부에 끌려가 불법구금과 온갖 구타 및 고문으로 조작하여 간첩으로 누명 썼던 김성환의 셋째 김상원이 2013년 12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에서 재심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슬프지만 통쾌하다. 이 책의 재미다.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국가로부터 자아를 상실하고 공동체를 파괴당한 이들의 인생과 대화는 늘 모노드라마다. 이들은 무섭고 부끄러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지 못하고 늘 스스로 주절거린다. 아픔을 들어주지 않는 사회에서는 독백을 할 수밖에 없다. 나는 그저 그들의 독백을 들어주기만 하였다.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순간 독백은 대화가 되었던 것이다.”
이 대화가, 이 음식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비록 짬뽕을 먹을 때마다 물고문이 생각날지언정, 다시는 국가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감시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음식에 아픈 기억이 묻지 않도록.
1)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유대인 대학살을 지휘한 루돌프 아이히만이 “나는 명령에 따랐을 뿐”을 주장한 재판 과정을 지켜본 한나 아렌트의 보고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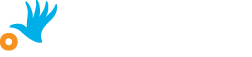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