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보기
[2018.11]
①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성소수자들의 인권 수난기 -
존재의 가시화, 폭력의 조직화
글 김희정, 사진 봉재석

비온뒤무지개재단 한채윤 상임이사를 통해 올 한해 차별과 혐오를 정리해보는 시간
주변에 있던 성소수자가 부각되고 주변에 없던 혐오세력이 늘어나는 한 해였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2007년부터 시작해 점점 가시화되면서 10년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더욱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동성애 혐오는 역대 정점에 달해 있다.
혐오가 조직화되고 있다
‘어떻게 싸울 것인가. 어떻게 지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국엔 우리가 가는 이 길이 맞을 거야’라는 긍정적인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나, 실상 많은 성소수자가 혐오와 차별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때로는 혐오와 차별이 발화점이 되어 성소수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한다.
과거 성소수자라 함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내 주변에는 없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풍조가 강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이어져 온 퀴어문화축제도 당시엔 별다른 반대 액션이 없었다. 축제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다. 2010년 SBS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가 방영되면서 ‘동성애’라는 소재가 전파를 타자 국민들은 흠칫 놀랐다. 아들이 보고 배울까 두려워 드라마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도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크게 동요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제삼자에게 있어 동성애는 눈살 찌푸려지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거리 축제에 반대 세력이 동참하기 시작했다. 2014년 처음 거리에 나온 성소수자 혐오세력 약 1,000여 명의 행렬은 신촌에서 진행된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를 막아섰다. 4~5시간쯤 대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지만 이후 행진은 재개됐다. 당시 사건은 집에서 웅크리고 있던 성소수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기폭제가 됐다. ‘약자인 우리도 해낼 수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한번 투쟁해보자.’ 직면할 용기가 생겼다.
2015년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퀴어문화축제에는 참가자가 대폭 늘었다. 2014년 집계된 5천~6천 명의 수치에서 3만 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그다음 해는 5만 명, 2018년에는 12만 명으로 껑충 뛰었다. 그러나 축제에 참가한 인원이 늘었다고 해서 혐오세력이 줄었다고 할 순 없다. 혐오세력 또한 더욱 조직화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행로를 막는 것뿐만 아니라 무참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노골적인 비하를 토해냈다. 조직화한 혐오는 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성소수자들을 지목했다.

<
극단으로 치닫는 편견의 작동
1990년대에 동성애는 그 의미가 모호했다. 당시만 해도 동성애란 ‘대를 잇지 않는 것, 불효하는 것’이란 유교 사상에 반한 죄책감이 드는 정도의 문제였다. 이후 2007년 차별금지법이 무산되면서 우리 사회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일부 종교 집단이 윤리적 입장을 표명하며 혐오세력의 리더 그룹으로 떠올랐다. 그들에게 동성애는 죄악이었다. ‘동성애자는 결국 에이즈에 걸려 죽는다’, ‘동성애가 늘어나면 사회가 타락해서 망한다’ 등 조직세력을 늘리기 위한 잘못된 정보는 범람했고, 성소수자들은 노골적인 공격에 무참히 당해야 했다. 그렇게 시작된 혐오는 점차 절정에 올라 2017~2018년 정치인들의 동성애 반대 공약으로 인해 더욱 조직화되고 정치 세력화되면서 공적인 사회 의제로 급부상하기에 이른다. 조직화된 혐오가 또 다른 혐오를 낳은 형국이다.
하지만 항상 부정적인 결과만 있으리란 법은 없다. 이 와중에 혐오를 반대하고 성소수자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앨라이)도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말한다. 그렇게까지 하는 건 심하지 않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고 산다. 너무 쉽게 혐오에 빠져들면서 정작 왜 혐오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 생각해보자.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신 이해하는 길을 택하면 어땠을까? 세상을 가늠하는 잣대가 꼭 극단의 선택이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아주 쉽게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으며, 정상의 역할은 당연히 다수의 몫이 되곤 한다. 하지만 그것은 편견에 빠지는 지름길이다. 당연하게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해는 그다음의 문제다. 무턱대고 “하지 마”라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고민의 시작이고 대화의 물꼬다.

인권 실현으로 가는 길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혐오, 차별 등 그것들을 무마시키는 가장 좋은 해답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 간단하다. 혐오의 대상에게 던질 말을 자문해보는 것이다. 나는 왜 이성애자가 됐지? 언제부터 이성이 좋았지? 명확하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 구성원들은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다. 그 편견들은 도처에 널려있다. 혼전 임신에 대한 수군거림, 미혼모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 이혼녀에 대한 낙인, 결손가정이라 부르는 사회적 행태 등 그것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깨닫지 못한다.
결국 혐오를 제지하는 근본적인 답안은 교육의 선행이다. 무작정 혐오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인권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더불어 언론과 대중매체에서도 함께 책임져줘야 한다. 결국 동성애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과제인 셈이다. 그들도 여느 보통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줄 때 인식 개선의 여지도 꽃을 피울 것이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존엄하다. 피부색이 달라서, 여성이라서, 장애인이라서 한때 배제됐던 인권은 사실 모든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애써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인권 실현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 긍정의 변화들이 정치적 이유로 탄압되지 않고 계속되길 바라며, 인권 실현으로 가는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 한채윤 상임이사를 인터뷰 한 글로, 한 채윤 상임위원이 유리문에 기대어 활짝 웃고 있는 사진과 인터뷰하는 모습의 사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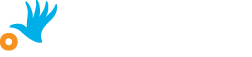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