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삶을 말하다
[2018.11]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기에 - 조성애 수녀
글 김희정, 사진 봉재석
사형 집행이 중단된 지도 어언 20년 남짓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한다. 짐승만도 못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 바로 사형수다. 그리고 군중 속에서 홀로 외로운 기도를 이어나간 이가 있다. 이미 떠난 사형수들을 생각하며 눈물짓고, 현재하는 사형수들을 어여삐 여기는 사형수들의 대모 조성애 수녀다.

예견된 만남
올해 나이 90세인 조 수녀가 오래된 기억을 되짚어본다. 어언 78년 전쯤이었을까. 초등학교 5학년 무렵 여동생을 따라 천주교에 입교한 것으로 기억한다. 세례를 받은 지 3년 뒤 6.25 전쟁이 발발했고 휴전 후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했다. 1955년 그녀는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입회해 수도자 생활에 접어든다. 머지않아 천주교 재단에 속한 성모병원과 성바오로병원에서 사목활동을 하기에 이른다.
교정사목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건 1976년. 1988년 본격적으로 사형수들을 만나 교정사목 활동을 시작했다. 근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 수녀가 돌봐온 사형수들만 100명이 넘는다. 누군가는 그들을 개돼지라 불렀고 하찮은 인간들을 도와준다며 욕도 서슴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모습으로 완전하지 않아요. 갖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욕구의 종류가 다를 뿐 모두에게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도 같은 인간을 재단할 수 없는 거예요. 바른길로 인도해서 회계하기를 바랄 뿐이죠.”
조 수녀는 처음 만났던 사형수를 떠올린다. 처음 그를 대면했을 때 무서웠던 기억을 회상한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의 손에 눈길이 갔다. “손이 참 곱다. 남자 손이 왜 이렇게 예쁠까” 하고 말하자 그의 표정이 달라졌다. 그녀의 관심에 마음이 열렸는지 묻는 말에 대답도 했다. ‘사는 동안 얼마나 정이 고팠을까…’ 당시를 떠올리니 마음이 아려오는 듯 말을 못 잇는 조 수녀. 이만큼 세월이 흘렀어도 생생한 기억인 듯, 어려운 회고를 부탁드린 것 같아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사형수 요셉
조 수녀에게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요셉(세례명)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던 그는 언어장애인 아버지와 시력장애인 어머니로부터 따뜻한 눈길과 손길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자랐다.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천덕꾸러기 인생으로 사춘기를 보냈다. 그 시절 인생을 비관한 요셉은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다. 그간 시력장애로 인해 일하는 곳곳에서 무시당해왔던 요셉은 당시 일하던 공장의 사장에게 모욕 받은 것에 참지 못하고 고객의 차를 끌고 나가 질주했다. 이 사건으로 2명의 사망자와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의도 자동차 질주 사건이다. 스무 살을 갓 넘은 꽃다운 나이의 요셉은 사형을 선고받았다.
“요셉은 제가 만난 사형수 중 가장 착한 아이였어요. 가족들을 비극적으로 잃은 데다 눈이 보이지 않아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어딜 가나 손가락질 받고 괄시 받기 일쑤였죠. 가정은 물론 사회에 나와서도 사랑 한번 못 받아본 불쌍한 아이였어요.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정녕 한 사람만의 잘못으로 책임을 돌릴 수 있는 문제였을까요.”
매주 금요일은 자신의 죄를 사죄하는 마음으로 하루 종일 굶기도 했고, 교도소에서 맛있는 부식이 나오는 날이면 본인은 먹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 주던 재소자였다는 것은 교도소에 익히 알려진 일화다.
그리고 1997년 12월 30일 김영삼 대통령은 그의 사형 집행에 서명했다. 요셉은 사형장에서 남아있는 영치금을 가난한 재소자들에게 나눠주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수다.

어찌 인간이 인간을
우리나라에는 사형제도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10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를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라 칭한다. 한국은 134번째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 됐다. 사형제도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사형 집행이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1980년대 이후 실질적 사형 폐지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제 우리도 사형에 관해 국제사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가. 죄가 미운 까닭에 사람도 미운 사람들에게는 쉬이 용납하기 어려운 논리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힘으로든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가 없다. 사형은 사형수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사형수의 가족이나 사형 집행인의 존엄성까지 해치고 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입니다. 잘못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은 없어요. 죄의 모양이 다를 뿐, 어리석음은 꼭 같죠. 사형수들이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을 함부로 심판할 수 없다는 말인 거죠. 무엇보다 생명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교정사목활동은 그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정신을 흩트려놓진 않았는지, 정신적 생명을 훼손하지는 않았을지, 평생에 남을 상처를 입히진 않았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 없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인간답게 살다 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자선을 베풀면 어떨까요.”
조 수녀는 오늘도 아침을 맞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요즘 들어 부쩍 언제까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이만큼 걸어온 길이 뿌듯하고 감사하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서 허락하는 만큼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글에는 벽이 하얀 방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손에 든 아이를 안고 있는 조각상이 있고, 벽에는 요람에 있는 어린 예수를 동방박사 3인이 바라보고 있는 사진과, 예수의 시신을 보듬고 있는 제자들의 사진이 걸려있고, 그곳에 서 있는 조성애 수녀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수녀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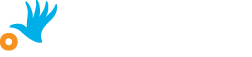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