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날 인권 [2020.01] 우한 교민 오던 날
글·사진 한겨레 신문사 오윤주 기자
1월 마지막 날, 막바지 겨울은 추위를 끝내 떨치지 못했다. ‘코로나19’. 이름마저 낯선 감염증은 세상을 얼게 했다. 그나마 추위는 사람을 모으고, 온기를 나누지만 이 녀석은 사람과 사람, 관계와 관계를 철저하게 차단하고 분리하고, 정을 뗀다. 문이 닫히면서 마음도 함께 닫혔다. 봄은 어디까지 왔을까?

교민 들어오다
불안·초조로 불면의 밤을 지새운 우리 교민이 우한에서 왔다. 무겁다. 무채색 표정도, 짐도, 어깨도….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우한에서 온 교민이 잠복기(14일) 동안 묵을 곳이다. 새초롬한 한기를 품은 안개 넘어 벽면에 붙은 ‘좋은 인재개발 따뜻한 인재원’ 글씨가 을씨년스럽다. 온몸을 하얀 방호복으로 가린 이들이 파란 약 탱크와 검은 소독 장비를 설치한다. 극성 취재는 없다.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다. 불안이 동반한 자연 차단 효과에 쓴웃음이 번진다. 국가 인재원은 충북 진천 혁신도시에 있다. 혁신도시 동남쪽으로 중심가에선 살짝 비켜나 있지만 1km 남짓 떨어진 곳에 버스 터미널·아파트·상가 등이 조성돼 있다. 인재원 앞엔 이미 경찰 반 기자 반이다. 촘촘한 경찰 버스 차벽은 사람은 물론 바이러스까지 차단할 기세다. 주민 혹은 교민, 누구를 위한 벽인지 알 수 없다. 벽 너머로 팽팽한 긴장이 흐른다. 주민 수십 명이 입에서 연신 하얀 김을 토해낸다. 이들은 정부의 진천 수용 발표 이후부터 인재원 앞을 지켰다. 더러는 화물차, 트랙터 등으로 인재원 앞에 바리케이드를 쳤으며 진천 수용 과정 등을 설명하러 온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물병을 던지며 항의하기도 했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비판 속에서도 주민들은 “반경 2km 안에 2만 6,000명이 생활하는 충북 혁신도시 안 인재원을 교민 임시 수용 시설로 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교민이 검역을 마치고 진천으로 이동할 시간이 다가오면서 긴장은 더욱 고조된다. 주변에 배치된 경찰 1,100여 명은 몇 안 되는 주민을 겹겹이 에워싸고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안개가 걷히고 추위에 곱은 손이 펴질 11시 무렵, 주민이 모인 곳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린다. 모든 눈과 감각이 그곳을 향했다. “교민들이 편안하게 와서 안정된 마음으로 생활하면 좋겠어요. 보름 동안 잘 쉬다 가셨으면 해요.”
사흘 동안 집회·농성을 이어온 주민들이 교민 수용을 발표했다. 기자들은 일제히 ‘진천 주민 우한 교민 수용’을 타전했다. 소리 없는 환호가 피어났다. 주민 대책위 대표가 말을 이었다. “우한 교민들이 불안 속에 있다가 힘들게 귀국한 것을 알아요. 우리가 애초부터 이들을 반대하거나 또 상처를 주려던 것은 아니었어요.”
주민들은 인권을 이야기했다. “우한 교민도 우리 국민이니까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가 품어야지요. 하지만 우리 주민들도 인권이 있잖아요. 교민들이 왜 우리 곁으로 올 수밖에 없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 두고 있는지 적어도 우린 사전에 들었어야 하지 않나요? 정부는 뭘 했나요?”
정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주민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 데 소홀했다. 입국 희망 교민 수가 계속 늘어났다”고 했다. 늦은 해명은 주민을 설득하지도, 이해시키지도 못한 변명이 됐다.

진천에서의 보름
오후 1시 22분, 경찰 호송 오토바이를 앞세운 채 교민이 탄 연갈색 작은 버스가 하나둘 나타났다. 10여 대가 멈추지 않고 인재원으로 들어갈 때 주민은 입을 다물었다. 몇몇 주민이 인재원 앞에 ‘우한 형제님들 생거진천에서 편히 쉬어가십시오’란 펼침막을 걸었다. 그사이 수용 반대 펼침막은 하나둘 걷혔다. “환영할 순 없지만 그래도 맞이해야죠. 교민한테 좀 미안하네요.”
이후 교민들은 조용한 홀몸 생활을 시작했다. 언론은 소란스러운 드론을 띄웠다. 그들에게 교민은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 아니라 관심의 대상, 취재의 대상일 뿐이다. 경찰이 나선 뒤에야 드론이 내려왔다.
우한 교민을 맞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민낯이 드러났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산·진천이다.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다’ 등 손팻말 운동으로 교민을 품자는 시민운동이 이어졌다. 교민과 주민을 도우려는 성금과 후원이 잇따랐고 위대한 시민 정신이란 찬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교민이 국민을 위험하게 한다는 근시안도 있었다. 교민 수용 반대에 나선 주민을 상대로 여론 공세도 있었다.
정부의 역할은 못내 아쉬웠다. 진천·아산 주민은 극적으로 교민을 품고, 보름 동안 쉼 없이 그들을 도왔다. 정부가 속을 보이고 미리 다가갔더라면 차디찬 겨울 착한 시민들이 아스팔트로 나섰을까?
언론은 가벼웠다. 수용 시설 결정 과정에서 나온 오보,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보도, 인권을 잊은 극성 보도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겨울은 봄을, 안개는 해를 품고 있다. 15일 오전 지독한 안개가 걷힐 무렵 교민이 떠났다. 보름 만이다. 인재원 앞길에선 위대한 진천·음성 주민 수백 명이 교민들을 환송했고, 퇴소 환영 펼침막이 나부꼈다.
‘꽃길만 걸으세요.’ 떠난 자리에 꽃이 피었다.
오윤주 기자는 한겨레 신문사 전국2팀에서 취재를 하고 글을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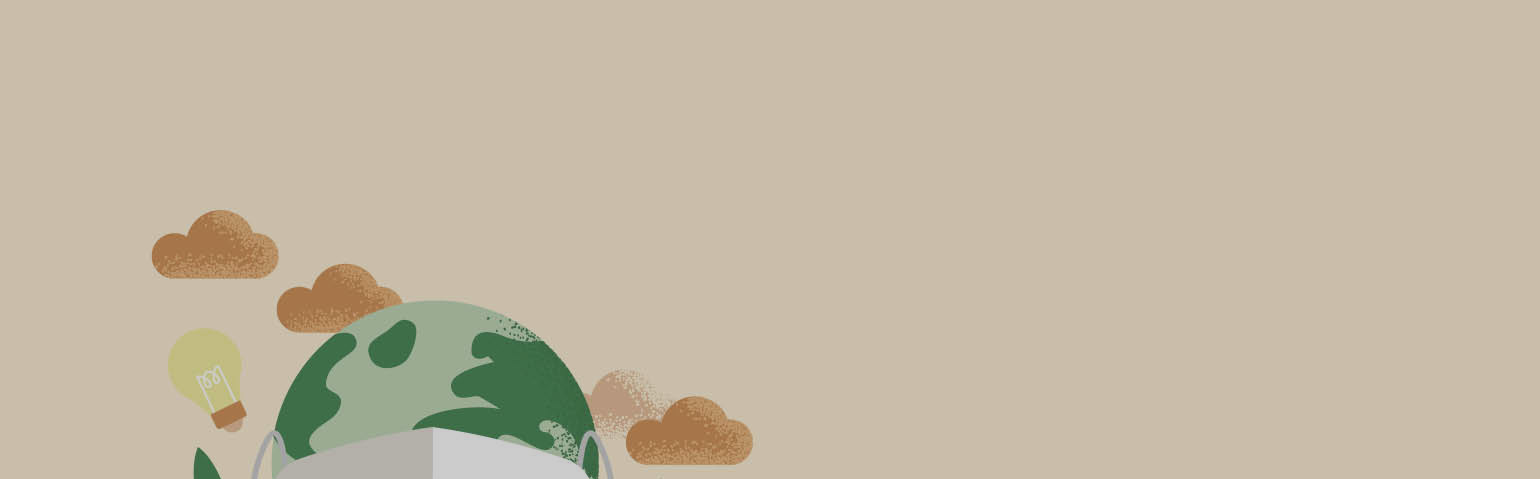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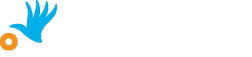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