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읽는 시간 [2023.07~08] 아버지 날 낳으시면 좀 어때?
크리스 맬컴 벨크 지음, 송섬별 옮김
「논바이너리 마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초등학교 5학년이던 나는 엄마의 손에 이끌려 청학동 예절학교로 여름 캠프를 갔다. 갑자기 조선시대 한가운데에 떨어진 듯한 기분에 미처 적응하기도 전, 훈장님의 입을 통해 들려오는 이 괴상한 소리는 어린 나의 심기를 거스르기에 충분했다. 아니, 분명 엄마가 날 낳았는데 아빠가 낳았다니 이게 뭔 소리지? 나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 모두 입을 모아 같은 질문을 쏟아냈고(“저 우리 엄마가 동생 낳는 것도 봤는데요!”), 젊은 훈장님은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어찌어찌 설명을 했으나 납득한 아이는 없었다. 아기는 당연히 엄마가 낳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아이를 직접 낳은 아빠가 있다. 크리스 멜컴 벨크는 논바이너리 트랜스매스큘린(지정 성별이 여성이나 젠더 스펙트럼에서 남성에 좀 더 기울어진 사람)으로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여긴 적은 없다고 밝힌다. 그러나 파트너 애나가 아이를 출산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렇게 아이와 연결되고 싶다고 느끼고, 정자 기증을 받아 샘슨이라는 아기를 출산한다. 논바이너리 마더는 여성이 아닌 존재로서의 임신과 출산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논픽션으로,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인 성 구분과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들 사이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정상가족이라는 규범성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그냥 그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크리스의 어머니가 그를 부를 때 제대로 된 대명사*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마다 크리스의 파트너 애나는 그저 그의 이름을 많이 부르라고 조언한다.
* 미국에서는 he/she에 담긴 성이분법을 해소하기 위해 젠더 중립 대명사(they나 ze)를 쓰거나, 상대방에게 어떤 대명사로 불리기를 원하는지 물어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 작가는 글에서 언제나 본인의 엄마를 복희로, 아빠를 웅이로 부른다. 그의 글에서 복희씨는 요리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웅이씨는 뭔가 고장나면 뚝딱뚝딱 잘도 고쳐낸다. 그러나 복희씨가 여성이자 엄마이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고 웅이씨는 남성이자 아빠이기 때문에 고장난 것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까닭은 이 실명 덕분이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림으로써 단순히 작가의 엄마, 아빠가 아닌 복희씨와 웅이씨 그 자체로 캐릭터화된다.
책 속에서 아이들은 사람들에게 크리스를 ‘우리 크리스’라고 소개하며, 크리스는 주로 자신을 아빠나 엄마가 아닌 ‘parent(부모 중 한 명)’로 지칭한다. 그러고 보니 우리말에는 parent와 같이 성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부모 중 한 사람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는 듯하다. 이렇게 말에서부터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는 부와 모가 서로 꼭 붙어 있어야 마땅하며 그 구성도 의심할 여지 없이 남성인 ‘부’ 하나에 여성인 ‘모’ 하나여야 함을 의미한다.
부모가 단어에서부터 공고히 엄마 또는 아빠로만 분류되고 있기에 사람들은 확신 없는 객관식 문제를 풀 때의 심정으로 주어진 선택지 중 하나를 찍어내는 건지도 모른다. 언어의 한계는 곧 인식의 한계이기 때문이다. 꼭 객관식 보기 중 하나를 골라야만 정답일까, 인생은 객관식이 아니니까 그저 복희, 웅이, 크리스여도 충분하지 않을까?
“아빠한테서 태어난 아이는 별로 없어요, 그쵸?”
샘슨은 종종 크리스에게 아빠에게서 태어난 아이는 드물지 않냐고 묻는다. 그리고 크리스가 고개를 끄덕이면 덧붙인다. “그러면 난 특별한 거죠?”
샘슨의 말처럼 외국에서도 흔한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례를 더욱 찾아보기 힘들 텐데, 그건 크리스의 ‘특별한’ 출산이나 가족 구성이 현재 우리나라 제도상으로는 아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크리스와 애나처럼 지정성별 동성끼리는 혼인이 불가능하고 비혼 상태로 정자 기증을 받아 출산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에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이 혼인하고, 그 안에서 자식을 낳는 것만이 바람직한 일이며 정상적이라는,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비혼 동거가족, 1인가구, 동성부부,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 현실 속 가족의 형태는 저마다 다양하며 점점 더 분화하며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오로지 한 가지의 가족 구성만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지난 5월 31일 국회에서 가족구성 3법이 발의되었다. 가족구성 3법이란 민법 개정법률안(혼인평등법), 생활동반자법 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비혼출산지원법)을 한 번에 묶은 개념으로, 각각의 내용은 혼인을 성별과 관계없이 쌍방의 신고에 따라 성립하도록 하는 것, 혈연 및 혼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생활동반자로 등록 시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것, 난임부부 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관 시술 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다양한 가족 구성이 이루어지는 세상은 정말 비윤리적일까? 삶의 동반자를 더 자유롭게 선택하면서 살면 정말 나라가 망할까? 자신으로 존재하고 관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일 따름일텐데 말이다.
하루 빨리 모든 구성원이 사회가 강요하는 가치가 아닌 본인의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바란다.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논바이너리 마더 속의 낯설고도 낯익은 면면들을 속속들이 발견하면 좋겠다. 그리하여 언젠가, ‘아버지 날 낳으시고’로 시작하는 시구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순간이 오기를.
글. 김나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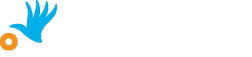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