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이 보기 [2023.09~10] #2 존재 이유를 증명해온 인권영화 스무 돌, 앞으로는?

올해 초부터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벌어진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를 보면서, 어느덧 2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기념비적인 첫 번째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2003)이 떠올랐다. 차례대로 임순례, 정재은, 여균동, 박진표, 박광수, 박찬욱 감독이 참여한 옴니버스 영화 〈여섯 개의 시선〉에 실린 여섯 단편 중에서도 여균동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대륙횡단〉(Crossing)이었다.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김문주 씨의 일상적인 사건, 감정, 기록을 11편의 에피소드로 구성한 단편이다.
자, 그런데 그로부터 20년 뒤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하철 기습 탑승 시위를 벌였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는 계속됐다. 특히 여의도에서 버스전용차로를 가로막고 “버스에 태워달라”고 요구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장애인 활동가의 모습은 〈대륙횡단〉의 마지막 장면과 너무나도 닮았다.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과 그중에서도 이동권 예산 확보, 그리고 장애인 권리 입법 제개정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 〈여섯 번째 시선〉이라는 인권영화를 떠올리지 못했다면, 아마도 최근의 전장연 시위를 보면서 편협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을 거란 얘기가 아니라, ‘언제 만들어진 어떤 인권영화’라는 것이 우리의 인권 의식을 점검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는구나, 하고 새삼 그 필요성을 실감했다는 얘기다.
한편, 인권 의식을 넘어 어차피 인권영화도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들이 연출자로 선정되어 제작되고, 이후 영화제에 소개된 뒤 정규 상영관 개봉을 통해 본격적으로 관객과 만나는 이른바 ‘상업영화’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지닌 공익적 의미를 초월하여 한 편의 ‘작품’으로서 한국영화계 내에서 차지하는 미학적 가치도 중요하다. 인권위가 매해 새로운 비전으로 제작하는 ‘인권영화’임과 동시에 극장 개봉을 목표로 하는 ‘한국영화’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바로 그 〈여섯 개의 시선〉 중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단편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는 그가 가장 최근에 연출하고 칸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2022)을 떠올리게 했다.
영화 속 이주노동자인 네팔 여성 찬드라는 1999년, 서울의 한 섬유공장에서 보조 미싱사로 일하던 중 공장 근처 식당에서 라면을 시켜 먹는다. 뒤늦게 지갑이 없는 사실을 안 찬드라는 계산을 하지 못하고, 식당 주인은 그를 경찰에 신고한다. 경찰은 한국어를 더듬는 찬드라를 행려자로 취급해 정신병원에 수감했고, 찬드라는 무려 6년 4개월을 살았는데, 충격적인 이 이야기는 실화였다. 언어와 소통 문제에서부터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의 삶을 지배하는 구조까지, 찬드라 역시 20년의 세월이 지나 〈헤어질 결심〉의 중국인이자 외국인노동자라 할 수 있는 송서래(탕웨이)와 겹쳐졌다. 〈믿거나 말거나, 송서래의 경우〉라는 표현은 〈헤어질 결심〉의 부제로도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면서, 어쩌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20년 전의 그 단편으로부터 〈헤어질 결심〉이 잉태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상상력을 발휘해본 것이다.
‘영화사 인권위’, 빛나는 존재 증명
〈여섯 개의 시선〉 얘기를 이처럼 길게 한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이 프로젝트가 왜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무려 20년 전의 작품이 일러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마다 만들어지던 인권영화가 해를 거르는 일도 있었고, 오히려 인권영화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해 더욱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더욱 힘을 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굳히게 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인권위의 인권영화 감독 선정 회의를 할 때마다 꼬박꼬박 참석해 의견을 냈다. 그때마다 선정위원들의 고민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사이에서 인권영화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대한 고민이다. 그것은 근본적인 정체성을 향한 질문이기도 하고, 지속가능성을 위한 흥행에 대한 고민이기도 하다. 또한 그것은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경계를 넘어 극장 개봉이라는 전통적인 방식과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OTT 시장 사이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나아간다. 지난 몇 년간 극장 개봉이라는 공고한 개념이 흔들리면서 이미 많은 한국영화들이 ‘OTT 개봉’ 혹은 한 편의 장편이 아닌 ‘시리즈 제작’을 고민 중이다. 두 번째는 톤 앤 매너에 대한 고민이다. 해마다 ‘올해 인권영화는 보다 대중적이고 경쾌한 접근법을 지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회의 시작과 동시에 자연스레 형성된다. 정답은 없지만 ‘인권영화는 딱딱하다’라는 고정관념은 어쩌면 영영 떨쳐내기 힘든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권영화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여러 굵직한 변화의 순간들이 있었다. 가령 옴니버스 영화 위주로 만들어오던 흐름을 깨고 임순례 감독의 〈날아라 펭귄〉(2009)이 처음 한 편의 장편영화로 제작됐다. 가장 최근의 작품이라 할 수 있는 14번째 영화 〈메기〉는 또 어떤가. 기존의 무겁고 주제가 도드라지는 형식을 벗어나 굉장히 경쾌한 분위기로 만들어졌다.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민평론가상’, ‘CGV아트하우스상’, ‘KBS독립영화상’, 그리고 주연을 맡은 배우 이주영은 ‘올해의 배우상’을 수상하며 사실상 그해의 상을 휩쓸었다. 장편 연출 경험이 없는 이옥섭 감독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알아본 곳이 인권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주영 배우는 물론 구교환 배우 또한 이후 〈반도〉 〈모가디슈〉 〈길복순〉을 비롯해 넷플릭스 시리즈 〈D.P.〉에 출연하며 한국영화계의 대표 배우로 훌쩍 성장했다.
감독 선정에 관여하는 일종의 ‘내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인권영화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의미있는 변화와 진화를 거듭해왔다. ‘영화사 인권위’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뿐더러 개인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재능있는 신인감독을 배출한 바 있는 한국영화아카데미의 ‘장편과정’과 유사한 역할을 해왔다고 본다. ‘과연 내년에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무려 2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다. 해마다 새로운 감독과 주제 아래 그동안 너무 잘해왔기 때문에 거꾸로 현재의 고민이 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 인권영화가 서 있는 경계 위의 모호한 위치, 극장과 OTT 사이에서 앞으로 보여줘야 할 비전, 그 모든 것들이 다양한 도전을 펼칠 수 있는 즐거운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렇게 인권영화는 지난 20년간 자신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증명해 왔다. 그렇게 또 다시 시작하면 된다.
글. 주성철(영화평론가, 유튜브 ‘무미건조’ 운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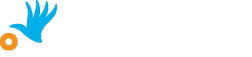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