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바로미터 [2024.03~04] ‘입법시민’으로서 총선을 건너는 법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헌법 제40조에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으니 유권자들은 국회를 구성할 입법권자를 선출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들을 놓고 고민할 때이다. 우리에게 법은 어떤 의미일까? 입법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그리하여 입법권자들을 선출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총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어떤 후보자를 선택할 것인가를 넘어, 이 질문들에 답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법치국가’와 ‘엄단’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위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엄정 대처할 것입니다”
사회적 분쟁 사건이 일어나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들어왔던 구절이다. 법에도 얼굴과 표정이 있다면, 이 문구에 인용된 ‘법치’에서의 법의 얼굴은 ‘잔뜩 화난 훈계자’의 표정을 짓고 있을 것만 같다. 사실 법치(法治)는 인치(人治)의 반대말이어서 국가 권력이 통치자 ‘마음대로’ 시민들을 통치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통제하고 견제하기 위한 운영 원리인데, 우리사회에서 이 용어의 쓰임은 주와 객이 뒤바뀐 형상이다. 진짜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법치가 필요한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도된 국가관에 한 번, 그 국가관의 권위적인 태도에 두 번 소외된다. 이것이 ‘법치국가’와 ‘엄단’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또한 우리는 준법시민 교육은 열심히 받아봤지만 입법시민 교육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입법시민이라는 말 자체가 낯설것이다. 결국 우리는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준법시민’으로 사는 것만 배워왔다. 법이란 이미 존재하는 것을 따를 뿐이지 만들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상상 자체가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이때 시민들이 만나는 법이란 그 자체로 권위적이며 확정적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잔뜩 화까지 내고 있으니 시민들은 법을 이미 만들어진 것이고 잠자코 따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이란 정말 그러한가? 법의 형성에 있어서 시민들의 자리는 어디일까? 다 만들어진 질서에서 그 질서를 지키느냐 마냐만 남은 것이 맞을까? 그렇지 않다. 주권자의 주권 행사의 핵심은 입법행위다. 입법행위가 시민들의 핵심적인 권한이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 정치학자는 “입법은 주권의 가장 본질적 표현(the essential expression of sovereignty)”(Burnham, 2009)이라 정의하기도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
이쯤되면 입법은 국회의원만이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우리의 상식과 부딪히게 된다. 물론 입법은 국회의원들이 한다. 그리고, ‘시민들도’ 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는 청원권이라는 헌법적 권한이 있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전에는 청원의 형식이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민청원의 인기에 힘 입어 이제는 특정 국회의원의 힘이 없어도 시민들의 힘만으로 입법이 가능해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라는 제도가 바로 이것이다. 청원안을 몇 줄의 글로 올리고 그 글이 일정 기간 동안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그 청원안은 ‘자동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이 바뀌었다.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 싶겠지만 우리나라 형사사법 법제의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냈던 ‘n번방 방지법’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이루어졌다(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안건이 바로 이 사안이었다). 국회의원들과 법학자들, 입법조사관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시민들의 이러한 집단적인 청원이 없었으면 이 정도 변화는 이끌어내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대핵을 이끌어냈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발 빠른 개정이 가능했던 것 역시 시민들의 청원 덕이었다. 공히 입법시민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여 주권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 이렇게 입법의 성과로 만들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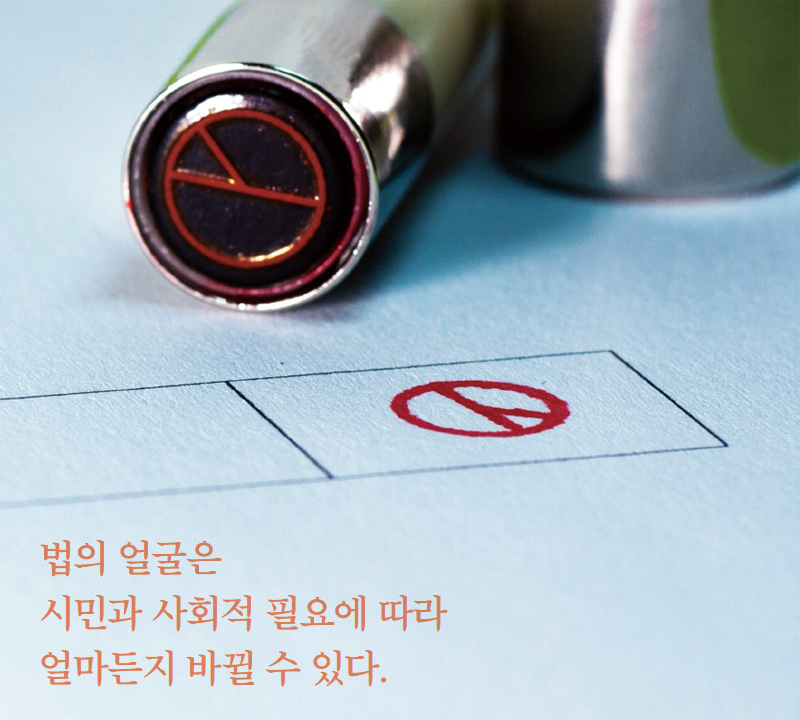
준법시민만이 아닌 입법시민으로
청원만이 아니어도 법안이 발의될 때, 심사될 때, 공청회를 할 때, SNS나 전화를 통해서 의견 개진을 하면 국회는 그 의견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국회가 외부에서 보기에 철옹성 같아 보여도 사회적 여론에 이보다 민감한 조직이 없다. 내가 보좌관으로 근무할 때에도 우리 의원실의 이름이 기사 댓글이나 SNS에 거론되는지, 여론의 동향은 어떤지 모든 안테나를 세워놓고 상시적으로 확인했고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그렇게 한다. 그것이 임명직 권력이 아닌 선출직 권력이 갖고 있는 권한의 특수성이기 때문이다. 이런 때 내가 읽는 법의 얼굴은 권위적이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응답적인 것이며 시민과 사회적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형상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서, 4월 우리가 겪을 총선의 의미는 전도된 주객을 다시 바꾸고 객의 자리에서 주권자의 원래의 자리를 찾는 과정이다. 그것은 투표 행위 한 번으로 충족될 리가 없다. 입법시민으로서의 주권행사를 하는 주권자라면 상시적으로 삶에 필요한 사항들을 입법으로 풀고, 주권을 위임해준 자들이 만드는 법과 정책을 상시적으로 감시해야 하는 일을 포함한다.
우리, 준법시민만 하지 말고 입법시민 하자. 그리하여 법의 권위적이고 엄정한 얼굴을 다시 시민들의 다양한 얼굴을 닮은 형상으로 바꾸어내자.
글쓴이 이보라는 10년 넘게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며 입법 실무를 담당했다. 책<법 짓는 마음>을 썼다.
글 | 이보라 (『법 짓는 마음』 저자, 전 국회 보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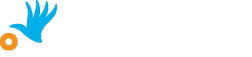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