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날 인권
[2020.09]
엘리트 체육, 그리고 사람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 죄를 밝혀줘.’
글 / 사진 매일신문 기획탐사팀 (이창환 팀장, 홍준헌,김근우 기자)
지난 6월 26일 오전, 부산시청 직장운동부 숙소에서 한 생명이 스스로 꺼졌다. 숨진 고(故) 최숙현 씨는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선수. 줄곧 경주시청팀에서 활동하다가 팀을 옮긴 지 5개월여 지난 시점이었다. ‘그 사람들’은 경주시청팀의 코치 진과 선배 선수들이었다. 최 선수는 이들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다 절망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동료 의지가 체육계 바꿀까
자칫 묻힐 뻔했던 그의 목소리는 한 언론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졌다. 최 선수를 사랑하던 이들은 생전 그가 겪었던 고통을 대신 알리기 시작했다. 경북 칠곡군에서 과수원을 하던 최 선수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딸의 억울함을 알리려 일손을 내려놓다시피 했다.
최 선수의 아버지는 그대로 기사화해도 좋은 만큼 숱한 팩트를 담담히 읊었다. 딸이 생전 부모에게 이야기했던 경험, 딸을 만나러 갔다 직접 겪었던 일들, 딸이 세상을 등진 뒤 남긴 일기장 속 기록과 동료들의 진술까지. 어느 언론에서도 눈물을 보인 적 없던 최 선수의 아버지는, 지난 7월 9일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자택에 방문했을 때가 돼서야 끝내 슬픔을 쏟아냈다. 애지중지 키워온 딸이 갖은 폭력과 모욕, 착취에 시달려 왔지만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슬픔. 그 감정을 오롯이 홀로 삭이고 있었으리라 생각하니 마음이 아렸다.
최 선수와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은 국회에서, SNS에서, 각자 할 수 있는 곳에서 피해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내부고발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가뜩이나 작은 체육계, 그 안에서도 군소 종목인 철인3종경기는 선수와 지도자들이 모두 얼굴을 알 정도로 닫힌 사회다. 자칫 ‘배신자’로 낙인찍힐 우려가 크다.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도 그래서였다. 그는 숨지기 전날 대한체육회 조사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반박 자료를 냈다며 추가 증거를 요구한 조사관에게 힘없이 “그런 자료가 없다” 는 대답을 해야 했다. 하루 종일 고된 훈련과 가혹행위에 지쳐있던 10대 후반의 최 선수에게 증거를 남길 여유 따윈 없었다.
가혹행위로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이들이 아무런 처벌 없이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 무력감이 결국 최 선수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넣었던 게 아닐까. 그렇기에 동료들은 더더욱 후폭풍을 생각지 않았다. 그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악습을 끊어야 한다는 의지였다.

고 최숙현 선수가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좌)
최숙현 선수가 생전에 썼던 일기장 (우)
인권침해 없는 엘리트 체육을 상상하자
“다시는 언니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폭력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체육 지도자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해줬으면 합니다.”
최 선수 사건과 관련해 현직 선수로서는 유일하게 실명을 밝히고 활동한 임주미(21) 씨의 말이었다. 21살 선수의 인터뷰에서 나온, ‘폭력이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이라는 문장에서는 일종의 절망감과 99년생 어린 선수마저 ‘체육계에서 폭력은 없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면화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반복되는 체육계 가혹행위 문제의 원인으로 누군가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인 군대문화를 지적한다. 혹자는 ‘올림픽 금메달’로 표상되는 성과 위주의 엘리트 체육 분위기를, 또 다른 이는 ‘체육계 특수성’이라는 이유로 이뤄진 관계당국의 느슨한 대응을 원인으로 짚는다. 모두 맞는 말이지만, 기자는 궁극적 원인으로 구성원들의 ‘체념’을 지목하고 싶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상당수의 체육인들은 ‘폭력 없는 엘리트 체육’을 상상하지 못했다. “없어져야 하는 건 맞는 데…”라며 말끝을 흐리는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작은 사회’인 체육계에 몸담으면서 그 규율과 복종문화를 내면화한 탓이 아닐까 싶다. 한때의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가 되거나, 또는 그에 동조하는 사례도 잦다. 이번 사건에서도 한때 폭행 피해 자였던 김도환 선수는 다시 가해자로 돌변해 최 선수를 폭행했다.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작은 사회에 성과 주의가 더해져 만들어진 일종의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이런 폐쇄적인 체육계에 균열을 가하려면 외부의 날선 감시는 물론, 내부 구성원들이 구축한 연대의식이 꼭 필요하다. 선수들이 자신이 당한 일을 ‘관행’이 아닌 ‘폭력’으로 규정할 수 있으려면, 또 체념하지 않고 대항해 싸우려면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최 선수가 생전 받아온 고통은 비극적으로 삶을 끊어 내고서야 끝났다. 하지만 아직 아픔을 겪는 다른 선수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하고, 삶을 되찾는다면 ‘최숙현’ 이름 세 글자가 남길 의미는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한 젊은 체육인이 떠났고, 그 결말은 남아있는 체육인들이 지어야 한다. 그게 살아남은 이들의 의무다.
이창환 팀장, 홍준헌•김근우 기자는 매일신문 기획탐사팀에서 대구경북 전역의 기획•탐사취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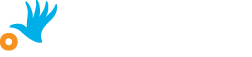


 페이스북 1
페이스북 1 트위터 2
트위터 2 카카오톡 3
카카오톡 3 카카오스토리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4
네이버블로그 4  밴드 5
밴드 5
 해당호 목록
해당호 목록



